서울사랑
[서울의 소울] 서울에 남아 있는 것들이 서울을 증명한다
문서 본문
시인은 서울의 동네를 걷는다. 골목을 탐험한다. 곳곳에서 느껴지는 사연들.
시인은 서울에 오래 쌓인 그 사연에 서울의 소울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골목에 들어설 때면 탐험에 나서는 기분이 든다. 큰길은 경쟁하듯 빨리 걷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출퇴근을 위해, 약속 시간을 지키기 위해, 남보다 먼저 무언가를 사기 위해 다들 걸음을 재촉한다. 큰길에서 멀뚱대고 있다가는 생면부지의 누군가에게 불호령을 들을 것만 같다. “여기서 대체 뭐 하는 거요?” 쭈뼛거리면서 나는 길가로 몸을 조금 옮길 것이다. 골목이 있다면 얼른 그쪽으로 방향을 틀 것이다. 골목은 적어도 속도에 있어서는 안전하니까. 잠시 머물러 있어도, 천천히 걸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으니까. 탐험의 목적은 불분명하지만, 그 끝에는 늘 사랑이 있다. 사람 냄새가 진동한다.
서울에 올라온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내 삶의 절반을 서울에서 보낸 셈이다. 이사도 여러 차례 했다. 살 집이 정해지고 나면 으레 동네 산책을 하는 것으로 그 동네를 몸에 익혔다. 이는 동네에 길드는 일이자 깃드는 일이었다. 동네를 거닐며 앞으로 여기서 무얼 하며 지낼지 상상하기도 했다. 이 집에서 산나물비빔밥을 먹어봐야지, 공원 산책을 마친 후 저 벤치에 앉아 꽃과 나무를 구경해야지, 여름철에는 저 집에서 팥빙수를 먹는 게 좋겠어, 내일은 이 길로 걸어갔다가 저 길로 돌아와야지…. 상상은 끝없이 이어졌다.
동네를 한 바퀴 크게 돌고 나면 이제 골목 탐험에 돌입할 시간이다. 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골목에 새겨진 자취가 동네의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골목 곳곳에 새겨진 사람의 흔적은 서울이 하루아침에 세계적 대도시가 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아무리 지워도 흐릿하게 남아 있는 담벼락의 낙서, 낡은 철제 대문, 허물었다가 다시 쌓아 올린 집, 오랫동안 제자리에서 피고 졌을 이름 모를 꽃, 무수한 사람이 밟고 지나갔을 길…. 남아 있는 것들이야말로 어떤 존재를 생생하게 증명한다. 존재의 존재함을. 그러므로 발자취를 하나하나 더듬는 작업은 내가 몸담은 현장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문득 울컥하기도 한다.

서울의 자취를 더듬으며 서울을 느낀다
서울 곳곳에 있는 골목들이 기억난다. 홍대와 신촌 사이에 있는 창천동 골목길에는 이색적인 상점이 즐비했다. 충무로 인쇄소 골목에서 느껴지는 열기로부터 노동의 리듬감을 익혔다. 양재천 일대의 골목에는 자유분방함이 흘러넘친다. 유연해지고 싶어 걸을 때 나도 모르게 기지개를 켜게 된다. 합정역 7번 출구에 길게 나 있는 골목에서는 눈이 바삐 돌아간다. 일직선으로 뻗은 골목이지만 홀린 듯 이쪽저쪽을 바라보다 보면 시간이 훌쩍 흘러간다. 정동길 골목은 또 어떤가. 옛날 포스터와 벽화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시간을 헤아리게 된다. 그 시간은 삶으로 똘똘 뭉쳐 있다. 삶을 향해 아직도 발끝을 옮기는 것 같다.
골목에는 사연이 있다. 그 사연을 짐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골목은 비밀을 품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골목과 주로 쓰이는 용언들을 보면 이 사실이 좀 더 분명해진다. 접어들다, 들어서다, 돌다, 빠져나오다 등 입장하지 않으면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이야기가 하루 또 하루 수놓였을 것이다. 이전에는 이 자리에 무엇이 있었겠구나, 사람들이 저기로 이동하려면 이곳을 반드시 지나쳐야 했겠구나, 골목이 한데 모이는 여기가 약속 장소로 제격이었겠구나, 저기 솟아오른 턱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꽤 많았겠구나, 가로등과 전봇대 뒤에서 엄마나 아빠가 오는지 지켜보던 아이가 있었겠구나…. 혼자 나왔다가 둘이 돌아가는 장면은 생각만으로도 애틋하다.
서울 골목 산책이 탐험이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간판 등 외관을 보고 내력을 짐작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나붙었을 벽보의 흔적을 매만지며 세월을 쓸어내리기도 한다. 수십 년은 족히 되었을 가게 안으로 들어가 음료수를 사고 나오는 길에는 지그시 가게의 간판을 바라 보기도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왔을까, 찾는 물건이 없어 빈손으로 나온 사람은 없었을까, 그때마다 주인 할머니는 오늘처럼 웃어주셨을까…. 상념은 길어지고 사연은 켜켜이 쌓인다. 이처럼 골목을 탐험할 때는 말줄임표와 친해져야 한다. 다 말하지 않았기에 더 많이 떠올려야 한다. 생략된 말들 사이로 서울도 성실하게 나이를 먹었을 것이다.
서울 곳곳에 쌓인 사연과 사연
골목길에 있는 노포(老鋪)에 들어선다. 외관이 허름하다고 해서 사연이 남루한 것은 아니다. 미닫이문을 열 때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마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하다. 내가 여기 이토록 오래 있었다고, 여닫을 때마다 한숨이 빠져나가고 활력이 스며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문을 여닫는 일은 마음을 여닫는 일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땀이 송골송골 맺힌 사람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하다. 버텨온 세월의 결실 같기도 하고, 제대로 해보겠다는 포부나 의지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그들이 거쳐왔을 골목을 다 헤아리다가는 찌개가 식어버릴 것이다. 나는 수저통을 여닫으며 마음 한 조각을 가만히 탁자 위에 둔다.
창문 밖으로 집을 향해 또박또박 혹은 또각또각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인다. 오늘 치 사연을 품고 내일 치 사연을 기대하며 집에 도착할 것이다. 오늘처럼 내일도 심상하게 이 골목길을 지나칠 것이다. 집에 들어설 때 훅 끼쳐오는 온기에 흐뭇하게 웃을지도 모른다. 서울의 소울(Soul, 영혼)은 골목에 있다. 그리고 그 소울에 매료되지 않기란 쉽지 않다.
글. 오은(시인)
<현대시>를 통해 등단. 시집 <호텔 타셀의 돼지들>,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왼손은 마음이 아파> 등을 출간했다. 대산문학상, 현대시작품상, 구상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24-07-02 |
| 관리번호 | D0000051148225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06-04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24-03-25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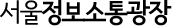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