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내리실 분 안 계시면 오라이~”
문서 본문

“ ~, ~, ~” 단발마의 기계음이 버스 안을 울린다. 작금의 청소년이나 청년 세대들에게는 이처럼 IC칩이 내장된 교통 카드나 해당 애플리케이션이 깔려 있는 스마트폰 따위로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예전처럼 승차권을 미리 구입해두거나 운전기사님이 거슬러주는 잔돈을 기다리지 않아도, 얇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이면 곧바로 직진통과에다가 기본요금은 물론 환승 요금 할인까지 받을 수 있으니, 한마디로 편리와 절약을 겸비한 일거양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얼리 어답터(Early Adopter)라는 소비 행태는 그저 다른 나라의 이야기일 뿐, 전원이 켜지고 작동까지 문제없다면 제아무리 낡은 버튼식 가전제품일지라도 잘 버리지 못하는 ‘느리고도 아날로그’적인 나로서는, 집 밖에 나와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들을 이용할 때에나 세상이 점점 더 ‘빠르고 디지털’하게 변모하고 있음을 새삼 절감하곤 한다.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짜여 있는 버스와 지하철 노선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앱 사용법을 익히다 보면, 때로 그리 멀지 않은 옛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시나브로 어쩔 수 없는 격세지감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다.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1970년대는 버스 아니면 안 되는 버스의 전성시대였다. 중·고교와 대학을 거쳤던 1980년대에도 버스는 여전히 대세였다. 서울역~청량리 간 제1호선과 신설동~종합운동장 간 제2호선이 처음 개통된 때가 각각 1974년 8월과 1980년 10월의 일이었으니만큼 지하철만으로는 이동의 폭이 크지 않았고, 무엇보다 버스 없이는 멀리 있는 지하철역까지 갈 수도 없었다. 넓디 넓은 서울에서 이러한 사정은 제5·6·7·8호선이 착공되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일정 부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버스, 버스 하다 보니, 바늘 가는 데 실 가듯 회수권이 떠오른다. 1957년 버스승차권 제도가 도입된 후, 어른들은조그마한 엽전처럼 생긴 ‘토큰’을, 학생들은 종이로 제작된 ‘회수권’을 사용했다. 회수권은 중고생들에게 요금 할인혜택을 주기 위한 쿠폰이었던 동시에 학교 앞 분식점이나문방구에서는 마치 현금처럼 통용되기도 했으므로, 우리들은 ‘회수권 보기를 금같이’ 여겼다. 간혹 용돈을 좀 아껴보려는 아이들은 10장 단위로 일렬 인쇄된 이 회수권 용지를 칼과 자를 이용해 11장으로 그럴듯하게 잘라내는 잔기술(?)을 발휘하기도 했다.
하지만 ‘뛰는 회수권 기술자 위’에는 ‘나는 버스 안내양 언니’가 있었다.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앞문과 뒷문이 있는 지금과 달리, 당시만 해도 버스의 출구는 중간에 달린 문 하나가 전부였다. 이곳으로 탔다가, 목적지에 이르러 문 안쪽 계단에 서 있는 안내원에게 회수권을 건네주면 정차를 알리는 벨이 울리고, 안내원이 이 문을 열어줘야 승객이 내릴 수 있는 구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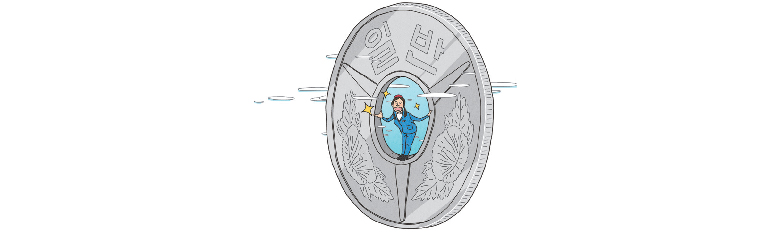
하루는 남자 고등학생 하나가 하차와 동시에 슬쩍 11장짜리 불법(!) 회수권을 건넨 모양이었다. 안내원 언니는 온전한 회수권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왼손으로는 버스 문손잡이를, 오른손으로는 남학생의 책가방 손잡이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당황한 남학생이 힘껏 저항했지만, 안내원 언니의 손힘과 강단도 만만치 않았다. 마침내그녀는 남학생이 입고 있던 교련복 왼쪽 가슴의 이름표를 바라보며 ‘너희 학교에 연락해서 신고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 ‘콩나물시루’ 같은 ‘만원 버스’를 견뎌내던 다른 학생들과 직장인들도 하나같이 안내원의 편을 들었다. 출발이 자꾸 지연되자 사람들은 열린 버스 유리창을 통해 불평과 꾸지람을 쏟아냈고, 아침 등굣길부터 톡톡히 망신을 당한 남학생은 결국 바지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들었다. 무척이나 표정이 상기되어 있던 안내원 언니였지만,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제야 다시 버스 벽면을 탕탕 두드리며 특유의 비음을 내면서 크게 외쳤다.
“내리실 분 안 계시면 오라이~”
버스 정류장마다 토큰과 회수권을 비롯해 껌이나 초콜릿, 쥐포 따위의 간식이나 신문과 잡지를 팔던 작은 점포들을 기억하시리라. 1984년에는 버스 정류장 안내 방송이 시작되었고, 안내원들만 누를 수 있었던 하차 벨, 그리고 자동문과 토큰 박스가 버스 내부에 설치되면서 버스 안내원이라는 직업도 점차 사양길에 접어들게 되었다. 기록에 따르면, 우리 시대 마지막 버스 안내원들은 1989년 4월까지 김포교통 소속 130번 버스에서 근무했던 38명이었다고 한다. 교통카드가 도입된 1996년 이후 2000년에 이르러서는 토큰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어, 박물관의 전시실 속으로 사라지고야 말았다.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청바지 뒷주머니에 꽂아두었다가 갑작스러운 비에 홀딱 젖어 잉크가 번지고 종이는 찢어지기까지 한 회수권 때문에 미안하고 곤란해진 나에게 고작 나보다 네댓 살 정도 많아 보이는 그 언니가 말했다. “제복 안주머니에 넣어두면 종점 도착할 때쯤 다 마를 테니 괜찮다”고, “어린애가 이 비에 우산이 없어서 어쩌냐”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옆에 서 있던 배려 없는 아저씨의 우산에서 똑똑 떨어지는 빗물이 언니의 하얀 운동화를 적시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상하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북적대던 종로2가 버스 정류장, 빗속에서 언니가 내 쪽을 향해 인사처럼 외쳤다.
“내리실 분 안 계시면 오라이~”

글 배선아(칼럼니스트) 일러스트 어진선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16-07-19 |
| 관리번호 | D0000028036876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22-11-30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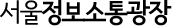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