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엄마 아빠 어렸을 적에]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문서 본문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 있는 꼬까신 하나~”, “장난감 기차가 칙칙 떠나간다, 과자와 사탕을 싣고서~”, “금강산 찾아가자 일만 이천 봉, 볼수록 아름답고 신기하구나~” 어디서 많이 듣던 노랫말들이지 않은가.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처음 부르기 시작해 강산이 네 번 가까이 바뀐 이 시점에까지도 이 추억의 노래들만큼은 흥얼흥얼 입에 짝짝 붙는다. 맞다. 지역별로 세대별로, 유행하던 종류나 가사 일부분에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 운동장에서, 공원 놀이터에서, 동네 골목길 담벼락 밑에서 검은색 고무줄 사이를 팔짝팔짝 뛰고 넘으며 불렀던 바로 그 노래들이다.노래 없는 고무줄놀이는 상상도 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노래에 따라 기술과 동작도 달랐으니까. 위의 노래들이라면 대략 중급 정도에 해당되겠다. 고급 수준으로는 좀 더 복잡한 난이도를 지닌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하는 노래가 떠오른다. 초보들은 “월남, 화초, 수수, 목단, 금단, 초단, 일~”이나 “나리나리 개나리 잎에 따다 물고요~”처럼 비교적 짧은 멜로디와 쉬운 박자에 맞춰 다리 힘을 기르고 리듬감을 익혀 나갔다.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사의 여파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앞으로~”, “무찌르자 공산당 몇 천 만이냐~” 하던, 이제 와 돌이켜보면 어린아이들의 정서에 다소 적절치 않아 보이는 잔인하고 끔찍한 가사의 군가들도 있었다. 이 놀이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1764년 숙종 때 청나라 상인이 고무줄을 한양에 들여와 이때부터 고무줄놀이가 생겨났다는 설도 있고,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민간에 널리 보급되었다는 설도 있다. 내가 국민학교(현 초등학교)를 다녔던 서울하고도 1970년대의 고무줄놀이는 여학생들의 전유물이었다. 그때 나의 간절한 목표는 ‘한 살’을 먹는 것이었다. 떡국 한 그릇 뚝딱 먹으면 되는 그런 한 살이 아니다. 상대편 술래들의 발목,무릎, 넓적다리, 허리, 겨드랑이, 목, 머리를 지나 양손을번쩍 드는 만세와 그보다 좀 더 높은 만만세의 자세까지 9단계의 고무줄 높이를, 그것도 단 한 번의 실수 없이 거쳐야 얻게 되는 그 ‘한 살’이라는 전설의 영예 말이다. 결론은실패였다. 겨드랑이 단계에서부터는 도저히 두 발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 누구라도 물구나무자세로 공중제비를 돌아야 하는데, 나는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했다. 내가 고무줄놀이에 매료되었던 데에는 노래와 율동이라는 재미 이외에도 팀별 대항이라는 경쟁적 측면이 크게작용하지 않았나 싶다. 나의 국민학교 5학년 시절은 고무줄놀이의 최대 전성기였다. 키가 작아 ‘땅콩’이라는 별명을 지녔지만 놀라운 점프력과 운동신경을 지녀 가히 고무줄계의 여왕으로 등극한 수진이, 그리고 시험 보는 족족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누구에게 지는 걸 싫어했던 ‘안경’이라는 별명의 유미가 양대 축이었다. 내 역할은 살금살금 나타나 짓궂게 고무줄을 끊고 재빨리 도망치곤 하던 남자아이들을 혼내주는 일이었다. 우리 언니들은 그게 다 이성에 대한 관심의 표현이라며 낄낄 웃어넘겼지만, 탄력으로 튕겨 나간 고무줄에 내 종아리는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던지.

손등과 손바닥이라는 뜻의 데덴찌(手天地)로 편을 가른 후, 양 팀 대표가 다시 가위바위보를 통해 ‘땅콩’을 택할 건지 ‘안경’을 택할 건지 결정했다. 늘 그렇듯 팀 구성이 승패를 좌우하는 법이다. 지게 되면 이긴 편 아이들의 책가방과 신발주머니를 집까지 들어다줘야 하는 벌칙이 따랐다. 그래서 본 게임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우리는 대단히 흥분했고, 필사적이었다. “방금 네가 고무줄을 밟았네”, “절대 안 밟았네” 상대편의 사소한 실수에도 난리를 치고 승강이를 벌이던 그 때의 아귀다툼을 떠올리면 지금도 즐거운 웃음이 난다.내게는 1997년생 딸아이가 하나 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지나가는 말로 몇 번 물어보았다. 친구들과 고무줄놀이는 안 하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아이는 그게 뭔지도 잘 모르는 눈치였다. 도시의 발달로 아이들은 위험한 자동차들에게 아파트 마당은 물론 골목길도 빼앗긴 채 안전한 방 안에 앉아 온라인 게임을 즐겼다. 아이가 입시에 골몰할 정도로 다 커버린 지금, 나는 시나브로 미안해진다. 싸고 질긴 고무줄 몇 가닥에 양 볼이 발갛게 달아오르고 두 다리가 뻐근해질 때까지 티격태격하며, 땅거미가 지고 배가 고프도록 즐겁게 노래를 부르던 그 고무줄놀이를 경험시켜 주지 못했다는 사실에 무언가 큰 것을 놓친 기분마저 든다. 흠, 나무에 줄을 매면 둘이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슬며시 또 다른 종류의 웃음이 난다. 좋아. 이 싱그러운 봄날, 오랜만에 고무줄 한번 제대로 뛰어 볼까나.
배선아
칼럼리스트, 방송자가, 여행· 인터뷰 전문기자로 글을 써왔다. 종로구 동의동에서 태어나 그곳에 27년을 머물렀다.
글 배선아 일러스트 어진선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16-07-19 |
| 관리번호 | D0000028036836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22-11-30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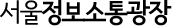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