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나의 서울] 신(新) 광화문 연가_정끝별
문서 본문
.jpg)
일찍이 서정주 시인께서 이르시길 “광화문은/ 차라리 한 채의 소슬한 종교(宗敎)”(<광화문>)라 했거늘, 내게도 광화문은 서늘하면서도 말간 한 채의 종교다. 저 광화문이야말로 열 살 즈음의 내가 조금씩 커가는 걸 지켜보았고 이제는 조금씩 늙어가는 걸 지켜보는, 의연한 관객이자 호젓한 목격자인 셈이다. “이젠 모두 세월 따라, 흔적도 없이 변해 갔지만, 덕수궁 돌담길엔 아직 남아 있어요, 다정히 걸어가는 연인들”로 시작되는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를 읊조리다 보면 오래된 덕수궁 앞 풍경들이 흑백사진처럼 펼쳐지곤 한다.
1983년 11월 덕수궁 앞. 미팅했던 한 남학생으로부터 온 학보 속에는 간단한 안부와 덕수궁 앞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가 적혀 있곤 했다. 그러다 말겠지, 하며 유야무야 한 계절을 넘기고 있었다.
“11월 11일 금요일 오후 5시에 덕수궁 앞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확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 같아 덕수궁 앞을 찾았으나 때마침 레이건 방한 반대 시위로 덕수궁 근처에는 진입할 수도 없었다. 운명이 빗겨가는구나 싶어,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그 남학생이 서있었다. 한 계절 내내 일방적인 약속을 통보해왔던, 내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내 신상을 털었던,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확신하고 있던 그 남학생을 향해 나는 기어이 물컵을 내쏟았던 것도 같다. 그때 나는 왜 그리 모나고 모질었을까.
그리고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 1992년 5월 덕수궁 앞.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남편의 회사 근처였던 경향신문사에서 시작되는 골목길은 덕수궁 앞에서 끝나곤 했다. 덕수궁 앞에서 시청 전광판 시계를 보며 우리는 늘 망설였다. 그곳에서 각자의 집을 향해 버스와 전철을 나눠 타고 헤어지는 게 가장 합리적임에도 우리는 번번이 서울특별시의회와 조선일보를 끼고 광화문 뒷길을 걸어 다시 경향신문사 앞에 이르곤 했다.
열살 무렵 서울로 이사 온 직후 나는 독립문 근처에 살았다. 매일매일 영천동에서 서대문 로터리의 금화초등학교를 오갔다. 그렇게 오가며 지나던 영천시장과 서대문 형무소는 충격이었다. 높은 담으로 가려진 서대문 형무소는 어쩐지 두려움 그 자체였고, 영천시장은 없는 것이 없는 만화경만 같았다. 어쩌다 생긴 용돈으로 막내 오빠와 시장통에서 사먹었던 군것질들, 특히 50원짜리 짜장면 맛은 사카린처럼 달콤했다. 내가 경험한 서울의 첫인상들이었을 것이다.
중학교 1학년 때 녹번삼거리로 이사해 결혼하기 전까지 15년 정도를 살았다. 숙명여자중학교는 종로1가 수성동에 있었고 나는 3년 동안 녹번동에서 수성동까지 통학해야 했다. 버스는 늘 만원이었고 승객들을 밀어 넣고 문을 닫는 게 버스 차장의 주된 임무였다. 한 명의 승객이라도 덜 태우려는 버스는 늘 정거장으로부터 가능한 한 멀리에서 문을 열곤 했는데 그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또 늘 무거운 책가방을 들고 이리저리 뛰곤 했다. 폭설이 내리면 버스는 무악재를 넘지 못했다. 승객들은 모두 내려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 무악재를 걸어서 넘어갔다.
고등학교는 남가좌동에 있던 명지여자고등학교를 다녔다. 과외가 금지되었던 시절이라 비행을 하듯 성문종합영어를 듣기 위해 종로에 있던 학원을 다녔던 기억이 있다. 그 즈음 휴일이면 나는 사직도서관이나 정독도서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자리를 잡으려면 새벽부터 서둘러야 했다. 시험이 끝나는 날에는 광화문 미리내 분식집으로 몰려가 쫄면과 튀김과 만두 등을 사먹었다. 친구들과 종로2가에 있던 화신백화점이나 신신백화점을 어슬렁거리기도 하고, 가끔은 서대문 로터리의 화양극장이나 광화문 로터리의 국제극장에서 영화를 보기도 했다.
대현동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종로서적 뒤편을 자주 갔다. 거기엔 멋진 커피숍과 경양식집과 그리고 디스코텍들이 많았다. 녹번동에서 한 10년, 결혼해 신혼집이 있던 남가좌동에서 한 2년, 도합 12년을 대현동을 오갔다. 이후 홍은동으로 이사해 지금껏 또 한 20여 년을 살면서 창경궁 근처의 열린사이버대학교와 남가좌동의 명지대를 거쳐 다시 대현동의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밥을 벌어먹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지난 40여 년을 서대문통이자 광화문통으로 살았다. 광화문 네거리를 축으로 반경 10km의 원을 그리면 동으로는 종로구 동대문과 혜화동, 서로는 은평구 증산동, 남으로는 마포구 합정동, 북으로는 은평구 연신내다. 그 안쪽이 나의 ‘나와바리’였다. 그 안이 내 삶의 공간이었고 그 밖을 넘어가면 내게는 먼 곳이었다. 그러니 나는 아직도 서울의 중심이 광화문 네거리라고 생각하고, 우주의 중심이 덕수궁 앞에서 바라보는 시청의 시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 안을 오간 데만 오가며 살았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아마도 오갔던 만큼을 다시 오가며 살 것이다. 광화문 네거리가 내 삶의 중심축이자 우주의 배꼽이니, 광화문을 ‘한 채의 소슬한 종교’라 할 만하지 않겠는가.
.jpg)
글 정끝별(시인, 이화여대 교수)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16-07-19 |
| 관리번호 | D0000028036869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10-07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20-09-02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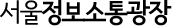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