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마음에 그 많은 가시를 지니고 살아질까?
문서 본문

| 눈에 티가 들어가면 견딜 수 없고, 이(齒) 사이에 조그만 것이 끼어도 참을 수 없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마음속에 그 많은 가시를 지니고도 오히려 아무렇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여곤, 《신음어(呻吟語)》 중에서 |
소설가 김별아의 ‘빛나는 말 가만한 생각’ 110
신음어, 책 제목부터 묘하다. “신음이란 병자의 앓는 소리다. 신음어란 병이 들었을 때 아파서 하는 말이다. 병중의 아픔은 병자만이 알고 남은 몰라준다. 그 아픔은 병들었을 때에만 느끼고 병이 나으면 곧 잊어버린다. 사람이 병들어 앓을 때의 고통을 안다면 모든 일에 조심하여 다시는 괴로움에 시달리는 시련을 겪는 일이 없을 것이다”는 서문을 읽으면 비로소 싸한 감동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끙끙, 아파서 앓으면 절로 신음 소리가 흘러나온다. 앓는다는 것은 가장 약한 상태, 따라서 가장 민감한 상태가 된다는 뜻이다. 배를 앓으면서는 함부로 먹은 것을 반성하며 앞으로 자극적이지 않은 부드러운 것을 골라먹겠다고 결심한다. 다리를 앓으면서는 발밑을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헛디딘 것을 후회하며 앞으로 발걸음을 조심하겠다고 다짐한다. 손끝의 상처나 난치병이나 내가 걸리면 경증과 중증을 헤아릴 필요 없는 고통이다. 고통은 나쁜 애인처럼 일상을 잠식하고 오직 자기에게만 집중하라고 요구한다. 그런데 사로잡혀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애인과 결별하는 순간, 후유증이 좀 남긴 하겠지만 그럭저럭 살 만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아니, 시간이라는 만병통치약 덕택으로 금세 까무룩 잊어버리기도 한다. 그처럼 어리석게 잊을 수 있어서, 사람은 언제고 살아낼 수 있는지도 모른다.
명나라 말기의 문신 여곤의 책 《신음어》에는 ‘중국의 목민심서’라는 별명이 붙어 있지만, 국가 경영의 길을 밝히고 관리들을 경계하는 가르침 외에도 썩어빠진 세상을 견디는 수양의 방도가 올올이 들어차 있다. 명말의 타락한 세상을 끙끙 앓으며 여곤은 스스로의 환부에 메스를 댄다. 그는 꽤나 아팠나 보다. 병과 고통에 대한 비유가 특히 날카롭다.
작은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 흐르고 금세 눈알이 새빨개진다. 이 사이에 고깃점이나 생선 가시가 끼었다 하면 성가시고 불편해 연신 혀를 밀고 잇몸을 비비며 쯧쯧거리게 된다. 우리의 몸은 본디 우리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 격렬하게 반응한다. 애초에 저항력이라는 보호의 기재를 장착하고 나왔기에 건강할수록 더 민감하게 대항한다.
하지만 마음속에 지닌 가시에만은 턱없이 둔감하다. 태어날 때부터 씨앗이 심어져있어 자라난 것도 아닌데 그 뾰족한 것을 꿀꺽 삼키고도 아무렇지 않다. 심지어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서 그것을 무럭무럭 키워 남들을 찌르는데 써야 마땅하다고 믿기도 한다. 그리하여 탐욕, 시기, 질투, 교만, 인색... 뾰족뾰족했던 그것들이 어느새 아무런 이물감 없이 내 것이 되어버린다.
건강한 몸은 민감하다. 아픔에 빨리 반응하기에 질병에 대한 조기 대응이 가능하다. 건강하지 못한 몸은 무감각하다. 어디가 아픈지 몰라 병을 키운다. 마음이라고 몸과 다를까? 아픈 줄도 모르고 마음속에 가시나무 숲을 짓는 사이, 신음도 없이 병들어간다.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김별아 | 생산일 | 2016-02-05 |
| 관리번호 | D0000041753735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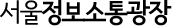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