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근현대 문화유산 답사] 민족종교의 교당이자 민족문화의 산실, 천도교중앙대교당
문서 본문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36호인 천도교중앙대교당은 천도교의 총본산 교당이며,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의거점이기도 하다. 건물 외부에 한민족을 상징하는 박달나무꽃과 무궁화 등을 조각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명동성당, 조선총독부 청사와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3대 건축물로 꼽혔다.
.jpg)
조선 말 혼란한 사회상과 더불어 기존 종교인 불교, 유교, 선교, 천신숭배사상은 그 존재 가치가 약해졌다. 이때 서학 천주교의 유입에 대응해 나타난 것이 동학이다. 1860년 최제우는 보국안민, 포덕천하, 광제창생을 선포하고 동학을 창시했다. 이후 최시형이 동학의 법통을 이어받았으며, 그 세력이 점차 확장되어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분출되었다. 1898년 최시형의 죽음 이후 1905년 3대 교주 손병희가 교명을 천도교로 바꾸었다.
손병희는 천도교 중앙 본당인 천도교중앙대교당을 건립했다. 처음에는 건평 4백 평 규모로 지을 계획이었으나 조선총독부는 교당이 지나치게 거창하고 중앙에 기둥이 없어 위험하다는 점을 핑계 삼아 불허했다. 손병희는 어쩔 수 없이 규모를 절반으로 줄여 겨우 허가를 받아 1919년 봄에 착공했다. 공사비는 300만 교도가 10원씩 모은 성금으로 충당했는데, 총 30만 원 중 27만원은 건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3·1운동 자금으로 사용했다.
1918년 12월 1일에 개기식(開基式)을 거행했으나 1919년 3·1운동으로 공사가 지체되었다. 1919년 7월 일본인 나카무라 요시헤이에게 건축설계를 의뢰해 1921년 2월 28일 준공했다. 나카무라 요시헤이는 한국은행 본점을 설계한 건축가로, 한국은행을 준공한 후에도 서울에 남아 숙명여고, 조선상공회의소, 군산·예산·대구 등지의 은행 지점 같은 건물을 많이 설계했다. 그가 설계한 건축물 중에서도 천도교중앙대교당은 한국 내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외벽에 민족을 상징하는 박달나무꽃과 무궁화 조각
이 건물은 전체적으로 아르누보의 한 부류인 빈 분리파풍 건축물로, 강렬한 적벽돌 외장이 주조를 이루고 일부는 화강석으로 강조했다. 평면은 T자형으로, 일반 기독교 교회당과는 다르다. 정면성을 강조하도록 장방형 매스를 좌우로 길게 배치하고 후면에 강당을 붙인 형태다.
건물 정면은 좌우대칭이며, 기단부는 화강석으로 볼륨 있게 디자인했다. 중앙 현관부에는 화강석으로 반원 아치를 둘러 쌓은 출입문을 두고, 현관 양 끝에 화강석으로 부축벽을 세워 장식했다. 전면 1층 창은 머리 부분에 화강석을 3개씩 끼운 장방형이고, 2층 창은 7개의 화강석을 끼운 반원 아치형이다. 정면 중앙에는 탑이 서 있는데, 탑 중앙부에는 반원 아치의 큰 창이 있고 상부에 3개의 작은 반원 아치 창을 냈다. 지붕은 바로크풍이며, 건물 외부에 한민족을 상징하는 박달나무꽃과 무궁화 등을 조각했다.
명동성당은 정통 고딕 양식으로 건축한 데 비해 이 교당은 여러 양식을 절충했지만 명동 성당을 뛰어넘으려는 의지가 중앙 탑을 중심으로 강렬하게 전해진다. 이 건물이 완공되자 한 언론은 명동성당, 조선총독부 청사와 함께 서울의 3대 건물로 평가했다.
천도교중앙대교당은 한국에서 태동한 천도교 교당일 뿐 아니라 3·1운동의 현장이며, 방정환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 운동이 싹튼 곳이기도 하다. 손병희의 사위인 방정환이 김기전 등과 함께 천도교소년회를 창립하고 이듬해에 ‘어린이날’을 제정·공포하면서 어린이 운동의 돛을 올린 것이다. 또 천도교청년회에서 창간해 당대 출판 문화 운동의 상징이 된 월간 종합지 <개벽>을 비롯해 <신여성>, <학생>, <어린이> 등의 잡지를 발행한 민족문화의 산실이다.
.jpg)
글 이정은 사진 문덕관 사진 제공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16-07-19 |
| 관리번호 | D0000028036736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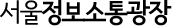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