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이야기가 있는 도시]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것들
문서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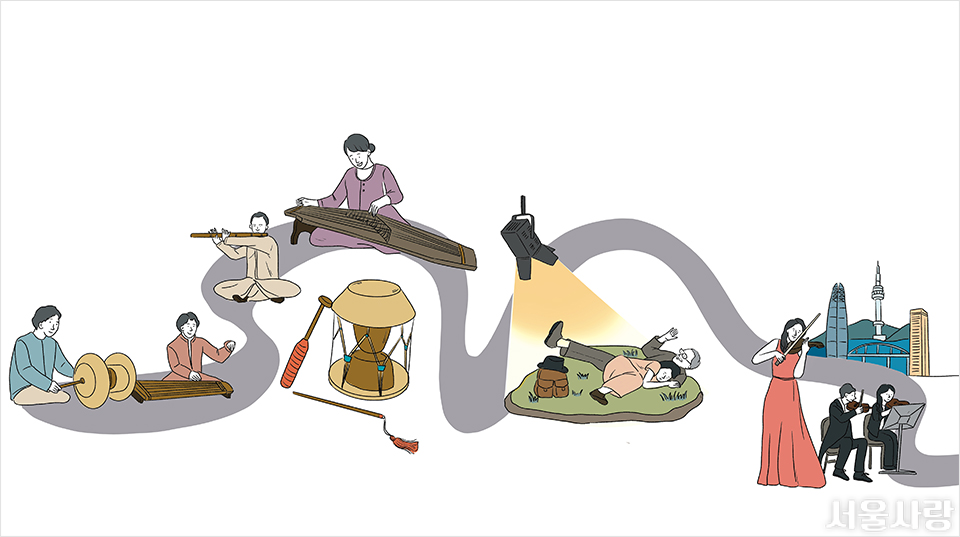
음악은 공간에 고인다. 발생하는 동시에 소멸하는 시간 예술이기에 그 잔향과 여운과 기억은 공간에 고인다. 예술의전당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자연스레 겨울의 입김이 따라붙는다.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보통 10~12월에 많이 열린다(다른 많은 공연도 마찬가지이지만). 연말의 들뜬 분위기, 사람들이 내는 웅성웅성한 기운, 피로한 내 어깨와 눈, 좋아하는 선배의 코트 자락 같은 것이 여기에 있다. 내가 좋아하는 몇몇 오케스트라의 소리, 이를테면 서울시향이 연주하는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4악장이 그곳에 흐른다. 예술의전당에 가면 기억 속에서 그 선율을 꺼내 들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공연 예술 분야를 취재하러 다니는 기자가 된 건 2011년이다.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한 작은 언론사의 인턴 기자가 되었는데, 합격 기준은 공연 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젊은이의 패기 정도였다. 공연에 대한 경험은 학부 교수님이 개최하는 음악회 몇 번이 전부였고, 어떤 눈과 귀와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당연히 알지 못했다. 뮤지컬 장르를 담당하던 선배를 따라 일주일에 네다섯 편씩 크고 작은 뮤지컬 공연을 보며 일하는 재미를 붙여나가던 어느 날, 몇몇 선배와 동기들과 LG아트센터를 찾았다. 지금은 마곡동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그땐 역삼동에 있었다. 나는 지금 소멸한 예술이 연주되었던 소멸한 공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때 우리는 한국음악앙상블 바람곶이 공연하는 <꼭두: 마지막 첫날>이라는 음악극을 보았다. 이 공연을 통해 나는 충격과 배움을 얻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소리가 있다, 이렇게나 아름다운 인간의 몸짓이 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같은 원초적 물음으로 집에 돌아가서까지 쉽게 잠이 오지 않던 기억. 내가 관객으로서 좋은 예술을 경험한 첫날이다. 이 작품은 상여를 장식하는 목각 인형인 ‘꼭두’가 현실적·비현실적 존재로 깨어나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인간 존재에 대해 고찰하도록 돕는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전통문화의 소재를 전통악기로 해석하면서도 완전히 현대적 방식으로 표현한 소리를 들으며 나는 그날의 무대가 온전히 내 것이 되는 느낌까지도 받은 것 같다. 다 흘러가버렸지만 전부 내 안에 남아 있는 것 같은 감각, 완벽한 몰입의 경험이랄까. 나를 키운 무수한 장면 중 이 무대가 맨 앞에 있다. 그보다 최신의 좋은 기억도 많다. 바이올리니스트 강혜선이 협연한 서울시향의 <아르스 노바> 시리즈(이것도 벌써 8년 전이다)와 바이올리니스트 김수연의 바흐 무반주 바이올린 작품 전곡 연주회(이건 7년 전)는 두고두고 간직할 귀중한 경험이라고 나의 첫 에세이 <아무튼, 클래식>에도 썼다.
“서울시향과 함께 파스칼 뒤사팽의 바이올린 협주곡 ‘상승’ 을 아시아 초연한 자리. 마치 현대를 사는 하나의 자아가 신을 향해 품은 복잡한 마음을 풀어내는 것처럼 보였다. 선생님의 바이올린은 매우 풍부한 소리로 긴장감과 추진력을 만들어내며 뚜렷한 색채를 빚어갔다.”(<아무튼, 클래식>, 140쪽) 여유가 있을 땐 민들레떡볶이에서 즉석 떡볶이를 야무지게 먹고, 그마저도 어려울 땐 공연장 건물 1층 바디쉐프에서 단백질을 욱여넣던 사사로운 기억까지. 이 글은 나의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안목과 취향을 든든히 배불려준 역삼동 LG 아트센터를 향한 고마움의 편지다.
이 시기를 머릿속에서 더듬어 살피다 비슷한 기억을 하나 더 발견했다. <꼭두: 마지막 첫날>과 같은 해에 극단 무천은 국립극장에 <모래의 정거장>이라는 침묵극을 올렸다. 대사없이 배우들의 신체성과 무대미술만으로 삶과 죽음, 즉 생명과 소멸이라는 철학에 대해 말하는 작품이었다. 나는 고(故) 백성희·권성덕·박정자·남명렬 같은 위대한 배우들의 이름을 이 작품으로 배웠고, ‘연극이란 무엇인가’ 같은 또다른 원초적 물음 앞에 도움이 될 귀한 경험을 또 하나 얻었다. 둥근 모래벌판 위에 무릎을 꿇고 앉은 고(故) 백성희 선생의 굽은 등과 작은 손, 그 사이로 스르르 쏟아지던 모래들, 그리고 그 아득한 표정이 여전히 내 가슴에 남아 있다. 작품을 다 보고 걸어 내려오던 늦가을 국립극장의 휑한 계단에서 나는 조금 울었던 것 같다. 백성희라는 뛰어난 배우는 이제 세상에 없지만, 그의 무대를 보았던 수많은 관객의 삶 속에 그의 몸짓이 크고 작은 의미로 머물러 있다. 서울의 시간은 다른 도시보다 빨리 흐른다고들 말한다. 수시로 개조되고 뒤바뀌는, 그래서 혼란하고 소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 그저 무의미한건 아니다. 어떤 예술은 나자마자 사라지는 운명을 타고났음에도 그 존재를 지속한다. 어떤 인간은 찰나의 몸짓으로 수많은 이의 수많은 시간에 머무른다. 사라졌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 서울이라는 도시에 고여 있다.
김호경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 미디어를 통해 음악을 경험하는 사람들을 연구했다. 클래식 음악 전문 기자로 일했으며,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아무튼, 클래식>의 저자다. 대중음악 가사를 쓰기도 한다.
일러스트 이새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23-12-04 |
| 관리번호 | D0000049743865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3-03-0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11-07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24-01-04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23-11-02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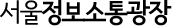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