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안에 서울
여름이 아니어도 좋다! 시원한 냉면 한 그릇
문서 본문

북한 정통 냉면 맛을 내는 '동무밥상' 냉면
정동현 맛있는 한끼, 서울 (41) 합정동 ‘동무밥상’
냉면은 어려운 음식이다. 한 젓가락 먹기 위해서 사람들은 냉면 족보를 논하고, 먹는 방식에 대해 논쟁한다. 그래봤자 차가운 면일 뿐인데 왜 그리 힘을 빼나 싶을 때가 잦다. 그러나 맑고 투명한 냉면 육수에 담긴 면 한사발을 보면 그 생각이 사라진다.
냉면은 어려운 음식이기 때문에 어렵게 먹는 게 맞는 듯싶다. 우선 육수를 차갑게 식혀 맑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나 돼지의 고기와 뼈를 채소 등과 함께 끓여 육수를 뽑는 것은 동서양 어디에나 있다. 하지만 이 육수를 차갑게 만드는 일은 아예 다른 차원이다. 프랑스 수프 콩소메도 냉면처럼 맑은 국물에 목숨을 건다. 하지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맛과 향을 쉽게 낼 수 있다.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맛과 향은 가라앉아 느끼기 어렵다. 그만큼 더 신경을 집중해야 그 맛을 느낄 수 있다. 자연히 냉면 육수 맛의 차이는 미묘함에 달린 일이 된다. 사람들은 그 미묘함을 알아차리기 위해 집중한다. 그리고 그 투입된 정신 에너지만큼 사람들은 주관을 가지게 되고 주관에 따라 주장하게 된다.
더구나 글루텐이 거의 없고 열에 민감함 메밀의 성질 상 면 뽑는 것도 어렵다. 찰기가 넘쳐나는 밀가루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근래 냉면을 둘러 싼 논쟁은 달라진 남북 관계에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어떤 냉면이 ‘맛있냐’가 아니라 어떤 냉면이 ‘북한’에 가깝냐는 것이다. 옥류관 냉면 사진 한 장으로 모양을 비교하고 연예인 인터뷰 한 자락에 맛을 짐작하며 정통이 무엇인지 밝혀내려 한다. 만약 냉면의 뿌리가 북한에 있고 북한 냉면에 최대한 닮아야 정통이라 주장할 수 있다면 당당히 목소리를 낼만한 집이 하나 있다. 합정동 ‘동무밥상’이다.
1998년 탈북하여 남한에 정착한 이 집의 주인장은 옥류관에서 교육을 받고 장성급 전용 요리사로 10년을 일했다. 딱 벌어진 어깨와 굵은 팔뚝을 보면 그의 과거가 헤아려진다. 날카로운 눈빛과 칼칼한 목소리는 벼려진 칼날과 묵직한 철퇴 같아서 함부로 할 수 없는 힘까지 느껴진다. 그 힘은 생사의 고비를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였다.
주인장은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건너와 2013년까지는 공사장을 전전하며 허드렛일을 했다. 그러다 후원자를 만나 ‘동무밥상’을 연 것이 2015년이었다. 겨우 15평 남짓 되는 작은 가게로 시작해 이제 벽을 터 옆집까지 규모를 늘렸다. 그가 옥류관에서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음식이 남달라서 가능한 일이었다.
마지막 이 집을 들른 것은 여름이란 계절이 아닌 폭염이란 재난으로 불려야 마땅한 어느날이었다. 좁은 골목을 넘어 대로변까지 줄이 이어 섰다. 냉면 한 그릇 먹겠다는 사람들이 그 줄 위에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보통 이런 수고를 하고 먹는 음식은 그 값어치를 못한다. 극도로 더운 날 입안 감각보다는 생존을 위한 쾌적함이 더 우선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우려는 테이블 앞에 앉았을 때 순식간에 가셨다. 나보다 먼저 냉면을 먹고 있는 사람들 표정이 보였다. 아찔하게 차가운 계곡 물에 몸을 담군 듯 했다. 그것으로 성에 안 차면 그들은 그릇 채 냉면 육수를 들이켰다. 그릇이 테이블 위에 다시 올라가면 반질반질한 바닥이 보였다. 깨가 송송 올라간 육수와 뱀처럼 잘 말린 면 똬리를 보았을 때 맛이 어느 정도 짐작됐다. 얼음처럼 차갑지도 냉장고 속 사이다처럼 탄산이 올라오지도 않는 육수를 먼저 들이켰다. 대략 영국에서 먹는 에일 맥주와 같은 7~8도 정도 되는 온도감이었다. 기름기 적은 고기의 매끈한 육향이 상쾌하게 올라왔다. 간간히 씹히는 깨는 밋밋할 수 있는 식감에 변주를 줬다.
이제 손가락에 힘을 줬다. 젓가락으로 면 똬리를 훌훌 풀고 기중기처럼 면을 들어올렸다. 나는 사슴을 삼키는 악어처럼 면을 입 안에 집어넣었다. 면은 면도날을 만난 동아줄이 끊기듯 입 안에서 툭툭 몸을 잘라냈다. 차가운 메밀의 금속성 맛이 혀에 닿았다. 냉면 육수와 면발은 서릿한 칼처럼 위장을 파고 들었다. 피도, 비명소리도 없었다. 단지 높고 외로운 산에 부는 바람처럼 몸을 떨게 만드는 한기만이 있었다.

씹는 맛이 좋은 만두(좌), 찹쌀과 귀리 등을 갈아 돼지피에 섞어 만든 순대(우)
냉면이 칼이라면 곁들인 만두는 전쟁터 뒤쪽 든든한 후방 같았다. 재료를 갈지 않고 다져서 만든 만두소는 씹는 맛이 분명했다. 만두피가 투명해질 정도로 꽉꽉 집어 넣은 형태는 요리사의 기술과 마음가짐의 또 다른 표현방식이었다. 찹쌀과 귀리 등을 갈아 돼지피에 섞어 만든 순대는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흔히 먹는 블러드 소시지(blood sausage)와 거의 유사했다. 서늘하고 거친 땅에서 먹는 음식이었다.
비록 이 땅의 여름은 결코 끝나지 않을 지옥처럼 땅을 달구고 사람들을 들볶지만 언젠가는 끝이 날 것이다. 그전까지 사람들은 미묘한 맛을 가르고 분별할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잃은 채 차가운 음식을 찾아 돌아다니리라. 천천히 찬바람이 불면 동무밥상 앞에 늘어선 줄도 줄어들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다시 동무밥상에 가련다. 사람들과 부대끼지 않고, 말을 섞지 않고, 홀로 앉아 냉면을 청할 것이다. 이 도도한 음식은, 주인장을 닮아 번잡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름이라 먹었지만 여름이 아니라면 더 좋을 음식이다. 그리고 어려워도 괜찮은 음식이다. 이 한 그릇에 담긴 수많은 여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대중식당 애호가 정동현은 서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 끼’를 쓴다. 회사 앞 단골 식당, 야구장 치맥, 편의점에서 혼밥처럼, 먹는 것이 활력이 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다. 대중식당 애호가 정동현은 서울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 끼’를 쓴다. 회사 앞 단골 식당, 야구장 치맥, 편의점에서 혼밥처럼, 먹는 것이 활력이 되는 순간에 관한 이야기다. |
본 콘텐츠는 서울시'내 손안에 서울'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내 손안의 서울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뉴미디어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정동현 | 생산일 | 2018-08-06 |
| 관리번호 | D0000041751739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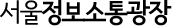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