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나의 서울] 서울 밤하늘에 나타날 새 별자리
문서 본문

시인이 될 운명이란
내가 시인이 될 수 있었던 건 서울로 입성했기에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장남인 나를 서울대학교 법대에 진학시키겠다는 작전을 펼친 아버지의 꿈이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주한 결정적 이유였으므로. 그때 나는 겨우 다섯 살이었다.
산골 출신인 촌사람의 서울살이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그것도 다섯 살인 나를 중심으로 위로 누이 둘과 아래로 남동생까지 있었으니 그리 많지 않은 기억만으로도 그때의 삶은 참 쉽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나는 서울에 살면서도 방학이면 시골에 살았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사이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욕망했다.
조금 정신을 차려 소년이 된 나에게 서울은 용광로 같다가도 늪지대 같았다. 놀이터 같다가도 가시밭길 같았으며, 오르막길인 듯하다가도 절벽이었다. 그 서울의 음과 양이 나를 시인으로 만든 것은 아닌가 하고 나는 가끔 생각한다. 도시와 산골의 강한 콘트라스트가 나에게 빨래방망이 역할을 해주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혼자 공부한 실력으로 온 가족 신생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사돈의 팔촌 이름까지 짓는 꽤 인정받는 작명가였지만 그게 업은 아니었다. 그러던 터에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름을 잘 짓고 싶었을까.
내 이름의 끝 자인 ‘률’은 아버지의 숙원이 담겨 법률의 률이다. 첫 번째 뜻은 딱딱하게도 그렇지만 두 번째 뜻은 운율의 뜻을, 세 번째 뜻은 시(詩)의 뜻을 담고 있다. 결과는 의도를 비껴갔지만 아버지의 욕망대로 아들의 운명을 자신이 지은 이름 안에 가둔 셈이 되었다.
인연의 인연이 걸어온 말들
지난가을이 시작되는 날, 옥출 선생님으로부터 문자가 왔다. 옥출 선생님은 서울계성고등학교의 국어 교사다. 처음 그를 만난 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고등학교에 강의를 해달라는 부탁이 왔는데, 그 부탁이 누구누구를 통한 조심스러운 부탁이었기에 기억에 남는 인연이 되었다. 지난 초겨울에도 나에게 강의를 부탁했다. 부탁하는 입장이라 이번에도 문자메시지의 목소리가 작아도 너무 작았다. 하지만 신바람은 숨기지 않았다.
이번에도 느낀 사실이지만, 옥출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하고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우선 학생들을 좋아해도 너무 좋아한다. 마치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 같다. 헤어스타일도 살짝 특이한데, 현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캐릭터가 아니라 나사 하나쯤 헐거워진 사람한테서 느낄 수 있는 특유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마치 꼭 고등학교 문학반의 반장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맞다. 만화 캐릭터를 떠올리기 쉬운 인상이라고 하면 옥출 선생님이 서운해 하실까.
늦가을에 막 접어들어 어쩌면 겨울이 막 덮칠지도 모를 것 같은 그날, 옥출 선생님은 아이들과 책을 같이 읽다가 도서관에서 나를 맞이했다. 옥출 선생님이 사회를 봤는데, 그 진행이 섬세해서 놀라고 말았다. 책 한 권을 다 읽고 자리한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라고 시켰다. 아이들이 몸과 말투를 꼬아가면서 조심스레 말을 걸어왔다. 내가 맘껏 누리지 못한 시절이 환하게 떠오르는 동시에 내 책의 글자 하나하나를 아껴 읽은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마음결이 느껴져 나는 그만 왈칵 눈물을 터뜨릴 뻔도 했다. 다행히 아무도 몰랐다.
지수, 명아, 여원 같은 학생들이 써서 건넨 손 편지를 받아 전철에 앉아 읽으면서 서울 하늘에 뜬 별들에 대해 잠시 생각했다. 서울이 너무 밝아서 보이지 않는 별들의 존재가 사실은 모두 그들이었음을 알고 또 알았다.
나는 옥출 선생님 같은 사람이 서울에 많이 살았으면 좋겠다. 옥출 선생님의 본심은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책을 통해 진정한 성장을 하길 바라고 또 바라니까. 서울이 나를 시인으로 만들었듯이 옥출 선생님의 은근한 불꽃이 아이들을 곱고도 단단하게 구워내고 있다는 기분이 드니까. 그랬다. 나도 소년기에 몇몇 선생님을 만난 덕분에 내 꿈을 잃지 않는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 서울에 사랑이 많은 국어 선생님이 더, 더, 더 많았으면 좋겠는 것이다
아이들이 써 내려가는 별
한 달에 두어 번 가는 동네 미용실에서 나는 가끔 이란성쌍둥이 아이가 써낸 시들을 읽는다. 어린 초등학생들이 시를 쓰기 시작한 건 미용실 주인인 엄마가 책을 좋아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이 사람을 키우는 건 마음이 마음으로 힘을 전달하는 일이다. 늦은 밤까지 여인이 미용실 문을 열어놓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하는 일은 동네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는 일인데, 그렇게 책으로 고와진 마음의 광채가 쌍둥이 아이들에게 고루 비치고 있는 것.
아이들은 엄마가 화분에서 기르는 토마토에 대해서도 쓰고, 치과 의사 선생님의 흰 수염에 대해서도 쓴다.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시를 잘 쓸 수 있어요?”라고 묻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넘치는 아이들의 세계는 흰 도화지 위에서 오색의 색깔로 빛난다.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시인이 된다고 하면 어쩌지요?”
여인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며 나에게 묻는다.
“뭘 어떡해요? 지팡이를 짚은 나의 후배가 되는 거지요.”
아마도 그 쌍둥이는 자라서 시인이 되어 나에게 줄을 긋고 지수, 명아, 여원에게까지 줄을 이어 하나의 별자리로 탄생할 것이다. 서울을 아주 오래, 건강히 비추는 단단한 별자리의 별로 빛날 것이다.
그 새 별자리의 이름은 무엇으로 지으면 좋을까?

이병률
<끌림>,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 <내 옆에 있는 사람>, <혼자가 혼자에게> 등 제목만으로도 우리를 설레게 하는 여행 산문집은 물론, <바다는 잘 있습니다> 등의 시집으로도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작가. 현재 ‘시힘’ 동인으로 활동 중이다.
글 이병률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20-01-07 |
| 관리번호 | D0000039163977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06-28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9-10-07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20-09-02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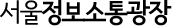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