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서울 생활사] 빈대와 하숙생
문서 본문
하숙은 대개 서울 외곽에 사는 가난한 조선 가정의 생계 수단이었다.
서대문과 동대문 밖, 한강 건너와 영등포 등의 언덕바지는 게딱지같이
다닥다닥 붙은 초가집으로 꽉 차 있었다. 바로 그런 곳에 하숙집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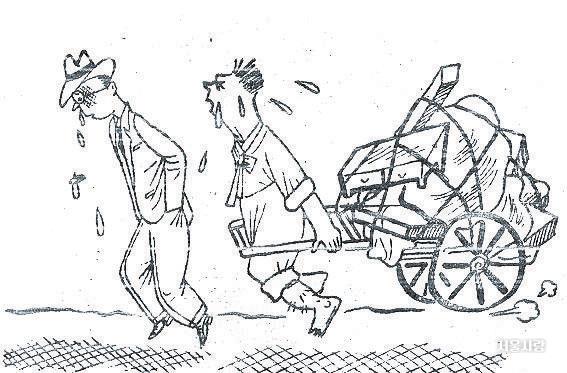
독신 생활자가 하숙집으로 이사하는 모습을 그렸다. 최영수의 ‘하숙 구걸 행장기’ (<신동아> 1936년 7월호 154쪽)
서당에서 학교로, ‘경성’ 유학생
옛날 말에 이르기를 ‘바싹 말라버린 논에 물 들어가는 소리, 자식들 목구멍으로 밥 들어가는 소리, 아이들 글 읽는 소리’ 이 세 가지가 살맛 나게 하는 소리란다. 글 읽는 소리를 들으려면 가르쳐야 했다. 조선 시대에는 주로 가정이나 서당에서 아이를 가르쳤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교육의 중심이 차츰 학교로 옮겨가기 시작했다. 초등교육기관인 보통학교가 곳곳에 들어서고, 중등교육을 하는 고등보통학교가 도시마다 생겨났다. 보통학교는 처음에 가난한 아이들만 다닌다는 뜻으로 ‘빈민학교’라고 부르기도 했다. 여전히 서당이 인기였다. 그러나 3·1운동 뒤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너도나도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 했다. 갑자기 몰려드는 학생 때문에 보통학교도 입학시험을 치렀다. 구술 고사와 서류 심사였다. 월사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었다. 중등학교는 나와야 먹고살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1920년대부터 치열한 입학 경쟁이 시작되었다. 그때부터 잘사는 집에서는 가정교사를 두거나 과외를 시켰다. ‘입시지옥’을 뚫고 서울로 중등학생이 몰려들었다.

하숙방에서 친구의 여드름을 짜주는 모습의 삽화. 벽에 여배우 브로마이드가 붙어 있다.(<학생> 1930년 2월호)
기숙사와 하숙방
일제강점기에 중등학교는 도시에만 있었다. 지방에서 온 학생을 위해 기숙사가 필요했다. 그러나 기숙사는 턱없이 모자랐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지방 학생은 친척집에 머물거나 하숙(下宿)을 했다. 하숙이란 ‘일정한 방세와 식비를 내고 남의 집에 머무는 것’을 말한다. 도시화와 함께 생겨난 현상일 테지만, 왜 ‘하숙’이라고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아랫방을 내준다는 뜻일까. 아마도 일본에서 건너온 말일 것이다. 그때 사람도 하숙이라는 말의 기원이 궁금했던 모양이다. 한 잡지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다. “지하실에서 자는지 값이 싸다는 말인지 왜 ‘하숙’일까. 어디서 굴러온 문자인지는 모르나 하숙집이라는 것도 간판을 붙인 ‘관허하숙’ 같은 곳은 여관과 마찬가지인 까닭에 구하는 것은 ‘여염집 하숙’이다.” 웬만큼 사는 집이 아니면 아들딸을 하숙시키면서 학교에 보낼 수 없었다. 하숙비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화학조미료 아지노모토를 쓰는 하숙옥이 인기라고 광고에 실었다. (<조선일보> 1934년 5월 5일자)
빈대의 공격
초라한 집일망정 남이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니는 하숙생은 행운아였다. 그럼에도 하숙의 고통은 있었다. 담뱃갑보다 조금 큰 방, 시원찮은 반찬, 물 쓸 때 주인 눈치 보기 등이었다. 하숙생이 많은 곳에서는 후배가 선배의 잔심부름도 해야 했다. 1937년 중일전쟁 뒤에 물가가 오르고 식량난이 겹치면서 하숙집에도 이상기류가 생겼다. 가정에서 쌀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하숙집에서는 하숙생을 받지 않으려 했다. 하숙집 주인들은 이익이 적고 힘만 드는 하숙을 그만두고 방을 비싸게 세놓으려고 학생을 내쫓았다. 또는 좁은 방에 세 사람씩 밀어 넣거나 음식의 질을 낮추었다. 일제강점기 끝 무렵 경성의 하숙 생활은 참담했다. 식량 배급제가 엄격해진 뒤부터는 굶주림이 학생들을 울렸지만,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빈대에 시달리는 것이 더 괴로웠다.
비 올 때 빈대떡이야 환영할 일이지만 잠잘 때 빈대는 환장할 일이다. 중국 갔던 사람이 어떤 벌레를 보고 신기해서 빈 대나무 통에 넣어왔다고 해서 ‘빈대’라고 불렀다 한다. 어찌하여 그 이름이 생겼든, 여름 땡볕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 빈대였다. 빛깔이 검붉고 넓적한데, 바닥에 착 달라붙은 생김새부터 고약했다. 낯짝이나 있을까 싶을 만큼 납작했다. 더구나 노린내 비슷한 야릇한 냄새가 나서 역겨웠다. 빈대는 의뭉하기 짝이 없었다. 밤이면 그렇게 설쳐대다가도 햇빛만 들면 어디로 갔는지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자다가 이놈에게 물려 뜨끔뜨끔해서 불을 켜면 잽싸게 도망쳤다. 벽을 타고 기어가다가도 잡으러 가면 벽에서 뚝 떨어져서 종적을 감추어버렸다. 이처럼 바싹 신경을 돋우어대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 경성에만 빈대가 있었던 것은 아닐 테지만, 흔히 사람들은 서울 명물로 빈대를 꼽았다. 잡지나 신문은 “서울에 빈대 없는 집은 흉가”라는 말을 자주 썼다. 좁고 무더운 방에서 빈대에게 뜯기다 못해 칠성판 같은 널조각을 깔고 하늘을 이불 삼아 거리에서 잠자는 사람도 많았다. 그 몹쓸 빈대가 굶주리고 지친 경성 하숙생을 밤마다 공격했다. 그래도 그들은 입학난과 취직난을 겪으며 암울한 식민 시대를 어떻게든 살아냈다.

빈대 알까지 죽인다고 빈대약을 광고하고 있다. (<매일신보> 1920년 7월 8일자 3면)
최규진 수석 연구원은 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한국 근현대 일상생활사 등을 연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경성부민의 여가생활>, <쟁점 한국사-근대편>, <제국의 권력과 식민의 지식> 등 다양한 저서를 출간했다.
글 최규진(성균관대 동아시아연구소 수석 연구원)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18-09-27 |
| 관리번호 | D0000034579262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01-10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9-01-08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9-08-28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8-08-28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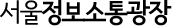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