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랑
[나의 서울] 외국인으로서 서울을 여행한다는 것_찰리 어셔
문서 본문
.jpg)
.jpg)
.jpg)
처음 접한 것은 여섯 살 때였다. 1988년은 서울에서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였다. 당시 올림픽 후원업체 중하나였던 브릭스&;스트래턴에서 일하던 작은아버지는 작은어머니와 함께 경기를 보러 서울을 방문했다. 스포츠라면 다 좋아했던 어린 나에게 올림픽은 그때까지 봤던 것 중 가장 멋지고 엄청난 행사였다. 하지만 어디서 올림픽이 열리는지는 잘 몰랐고, 솔직히 별로 관심도없었다.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니는 미국으로 돌아올 때 형과 내게 모자를 기념품으로 사다 주었다. 뻣뻣한 빨간 벨벳 천과 망사로 만든 못생긴 모자였지만, ‘SEOUL OLYMPIC’이 쓰여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에 꼭 들었다. 기묘하게 모음이 조합된 첫 단어는 끝없이 호기심을 자아냈다. 가운데 그려진 올림픽 로고 또한 마음을 사로잡았다. 노랑, 빨강, 파랑이 어우러져 회오리치는 물결은 최면에 걸린 만화 캐릭터의 눈을 묘사하는 흑백 소용돌이가 무지개색으로 변해 그려진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자는 옷장 속으로 물러났고 서울은 내 마음속에서 잊혀 갔다.그로부터 18년 후, 거의 충동적으로 한국에 이주하기 전까지 말이다.
.jpg)
나는 사실 한국의 문화, 음식, 언어, 그 어떤 것도 잘 몰랐다.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외국 생활’을 위해서는 여러모로 이상적인 상태였다. 여행을 하는 것은 새롭고 낯선 상황을 겪기 위해서다. 그런 면에서 서울은 내게 ‘세례식’과 같았다.
서울이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역동성이었다. 나는 미국 중서부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그 후 더 큰 도시에서 살아보기도했지만, 서울의 북적거림과 비교할 만한 곳은 없다. 한국의 수도는 멈춘다는 개념이 아예 없는 도시처럼 보였다. 술집은 주문 마감이 없어 보였고, 가게는 폐점 시간이 없어 보였으며, 시간이 늦어 뭔가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없어 보였다. 낮 시간만으로는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도시는 해가 저물어도 계속 바빴다. 나는 이 흐름을 따르기 시작했다. 해독할 수 없는 글자들로 반짝이는 간판들이 붙어 있는 비좁고 미로 같은 골목 사이로, 궁궐과 성곽이 전하는 낯선 시대의 낯선 이름들로 가득한낯선 이야기들 사이로 나는 그 흐름을 따라갔다. 삶과 신비한 이야기(Life and Mystery)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실제로 거의 모든 곳으로 그 흐름을 좇았다.
내가 여행 다녔던 다른 도시들과 서울이 구분되는 점도 결국 그두 가지다. 서울은 신비한 이야기가 어디서나 흘러넘친다.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여행자란 느낌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분명히 더 잘 알게 되었지만 한 번도 서울을다 안다고, 온전히 이해한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 서울은 언제나 많은 의문과 기분 좋은 궁금증을 유발하는 곳이다.
.jpg)
그 매력과 신비로움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다. 을지로 뒷골목의 공업사에서, 서촌의 낡은 한옥에서, 연남동과 성수동에 새롭게 생겨나는 젊은이들의 가게와 식당에서, 도시 곳곳에 있는 조선시대 궁궐과 성곽에서 그 매력과 신비로움이 나온다. 새로운 기술을 100% 포용하는 모습에서도, 불가사의하고 떠들썩한 음주 문화에서도, 모든 것이 변화하는 거침없는 속도에서도 그 매력이 나온다. 이런 것들은 하나같이 서울만의 것이며, 서울에서 겪는 삶의 일부다. 그것이 흉하든, 아름답든 말이다.
반대로 서울이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때는 단순화시키고, 미화하고, 신비로움을 없애 버리려고 할 때다. 외국인이 발음하기 편하라고 떡볶이의 표기를 ‘Teokbokki’에서 ‘Topokki’로 바꾸려한다든가, 외국인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행사장에 ‘외국인 전용’ 구역을 만든다든가 하는 것들이 그 예다. 이런 시도는 외국인들에게서 한국인들이 사는 진짜 서울을 경험하고 이해할 기회를 빼앗을 뿐이다. 경험에서 신비로움은 사라진다.
여섯 살 때 내가 올림픽 모자의 물결 로고에 그토록 호기심을 느꼈던 것은 그것이 뭔지 몰랐기 때문이다. 호기심이란 그런 것이다.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어떤 것.내 개인적으로, 또 외국인들 대부분에게 있어 서울의 매력은 보는 것과 이해하는 것 사이의 간극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다른 것일수록 서로 끌어당기는 자력(磁力)과 같은 것이다. 익숙한 것에서 멀리 있는 것일수록 나는 더욱 강하게 끌린다. 7년을 넘게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서울에 대해 모르는 것이너무 많다. 그 끌림은 여전히 강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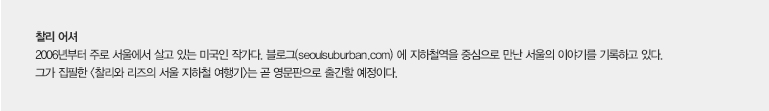
본 콘텐츠는 '서울사랑'에서 게재중인 콘텐츠 입니다. 서울사랑
문서 정보
| 원본시스템 | 서울사랑 | 제공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
| 작성자(책임자) | 한해아 | 생산일 | 2016-07-19 |
| 관리번호 | D0000028037064 | 분류 | 기타 |
| 이용조건 | 타시스템에서 연계되어 제공되는 자료로 해당기관 이용조건 및 담당자와 협의 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 ||
관련문서
-
등록일 : 2019-10-07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20-09-02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
등록일 : 2016-07-19 부서 : 시민소통담당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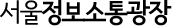
라이브리 소셜 공유1